책 만드는 사람들은 출판업계를 ‘홍대 바닥’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곳에 많은 출판사가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 예술의 거리로 불리던 홍대의 옛 정취도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책의 가치를 전하고 싶습니다. 홍대 바닥에서 활동 중인 여섯 명의 출판인이 돌아가며 매주 한 권씩 책을 소개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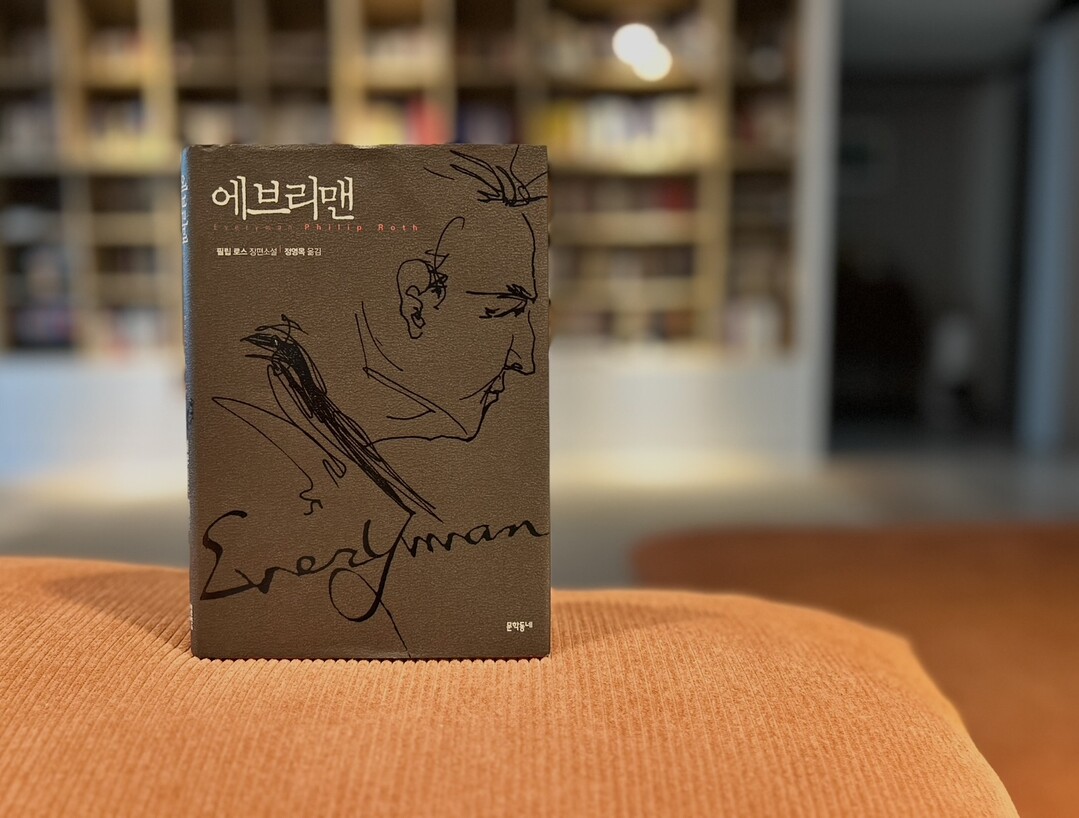 |
깜짝 놀라 나가보니 앞집 할아버지가 서 계셨다. 도움을 청하려던 건지 집을 착각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만은 분명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상 깔끔한 차림에 할머니 대신 분리수거를 도맡아 하셨는데. 겉모습이 많이 변해서 같은 분이란 걸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우여곡절 끝에 할아버지는 무사히 집으로 들어갔지만 나는 이 일로 한동안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한해 두해 늙는다는 걸 뼈저리게 체감하는 나이여서 그런지 남일 같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필립 로스 소설 〈에브리맨〉을 읽으며, 당시 당황하고 부끄러워하던 할아버지 눈빛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럴 수도 있지요, 라며 할아버지를 위로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그건 실존이 무너지는 경험이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단순히 겉모습이 늙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 일 때문인지 나는 〈에브리맨〉에서 밀리선트 크레이머라는 여성에 깊이 공감했다.
이름도 없이 3인칭 대명사로만 불리는 주인공 ‘그’는 큰 수술을 몇 번 치르고 퇴직한 뒤 스타피시비치라는 은퇴자 마을에 정착한다. 한때 광고업계에서 명성을 날리던 그는 그림을 그리며 사는 게 꿈이었고, 마침내 이 은퇴자 마을에서 그림교실을 연다.
밀리선트는 그림교실에 나오는 학생이다. 얼마 전 남편을 뇌암으로 잃었다. 게다가 자신은 심각한 척추 손상으로 보조기를 차야 하고, 그 고통은 이제 어떤 진통제로도 잠재울 수 없다. 밀리선트는 지역 유명인사로 승승장구했던 남편의 죽음도 자신의 고통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그녀에게 그림교실은 잠시나마 고통을 가라앉혀주지만, 그 시간은 정말 잠시일 뿐이다. 중간중간 작업을 중단한 채 노쇠하고 병든 몸을 뉘여 쉬게 해주지 않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이다. 밀리선트는 그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이렇게 말한다.
“정말 창피해요. …자신을 돌볼 수 없다는 거, 궁상맞게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거… 선생님은 몰라요. 의존, 무력감, 고립, 두려움… 그게 다 아주 무섭고 창피해요.”
하지만 누군들 안 그럴까? 가끔 약을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두통을 겪을 때 딱 저런 무시무시한 단어가 엄습하곤 한다. 하물며 이제 몸도 마음도 한물간 신세라고 느끼는 노년에는 어떨까?
“노년은 전투예요. 가차 없는 전투죠. 하필이면 가장 약하고, 예전처럼 투지를 불태우는 게 가장 어려울 때 말이에요.”
그 역시 체감하기 시작했다. 한때 그와 함께 광고계를 주름잡던 거물급 동료도 이젠 모두 죽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병원 신세다. 그는 또 한 번 큰 수술을 하기 직전 이들과 안부를 나누고나서 잔인한 현실을 깨닫는다.
“종말이 올 때까지 남아 있는 나날이 자신에게 무엇인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할 것 같았다. 목적 없는 낮과 불확실한 밤과 신체적 쇠약을 무력하게 견디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일.”
늙음이란 결국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밀리선트는 고통과 수치심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남겨진 시간을 받아들이고 버티기로 한다.
그는 마지막에 부모님이 잠든 묘지를 찾아가 아버지 음성을 듣는다.
“되돌아보고 네가 속죄할 수 있는 것은 속죄하고, 남은 인생을 최대한 활용해봐라.”
우리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그냥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버틸 뿐. 이것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에브리맨’이 할 수 있는 전부일지도 모른다.
 |
|번역가 조민영. 세 아이가 잠든 밤 홀로 고요히 일하는 시간을 즐긴다.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번역위원으로 참여했다.
[ⓒ 뉴스밸런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